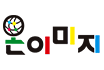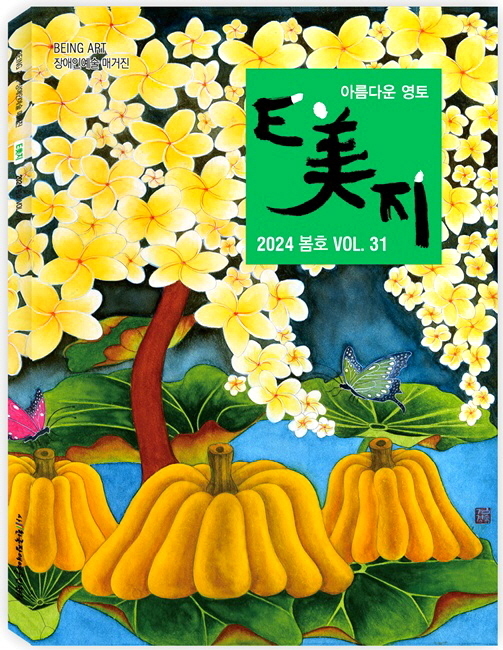글터
HOME > 솟대평론 > 글터
(작가 소개 필수)
- 황신애 조회수:1477 61.99.178.112
- 2020-06-19 14:21:36
부족허지만 우리 식구들과 공유하려고요.
꼭 그림을 그려라
읍내 중학생이 되어 미술시간에 받은 칭찬이었다. 숨이 막힐 것처럼 심장이 뛰었다. 온 몸으로 전해졌다. 내색하지 않았지만 내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. 미술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신 있고 재미있었다.
딱히 그림을 따로 배운 적은 없었다. 있다면 어렸을 때 고모네 집에 달려가 화가 오빠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. 오빠의 신기하고 신비로운 세상. 고양이 걸음으로 방해가 안 되게 숨죽이며 봤다. 그때도 심장이 두근거렸었다. 언젠가 내 그림이 교무실 복도에 걸리기도 했다. 달을 향해 날아가는 새를 그린 구상화였다.
“커서 꼭 그림을 그려라”
뜨거운 말이었다.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이다. 미래의 나는 한 치 의심도 없는 멋진 화가가 되어있었다.
하지만 화가가 꿈이라고 부모님께 말 할 수 없었다. 공부나 하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고 혼날 게 뻔했다. 어려운 어촌살림에 엄마가 폐결핵까지 앓고 있어서 더욱 말을 꺼낼 수 없었다. 엄마만 생각하면 한없이 불쌍했다. 죽지만 말아달라고 기도했다. 엄마의 기침소리가 자지러질 때마다 내 꿈도 자지러졌다.
중학교 3학년 봄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. 늪의 서막이었다. 밤마다 울며 잠들었다. 슬픔은 바닥이 없었다. 2년 후 아버지마저 간경화로 쓰러졌다. 우리는 또 다른 늪에 빠졌다. 새벽에 일어나면 재래식 화장실에 이동변기를 쏟으며 하루를 시작했다. 아버지는 마루를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로 기운을 잃었기 때문이다. 세 자식만 두고 갈 수 없다는 통탄할 의지로 버텼다. 아이처럼 자주 울었다. 술독에 빠져 살때는 언제고.... 하루아침에 원망의 대상에서 불쌍한 대상이 된 것이다. 애증이 뒤엉켜 뭐가 뭔지도 모르는 학창시절이 갔다.
어른이 된다는 것은 늪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거였다. 늪에 빠져 세상으로 넝쿨을 뻗는 거였다. 지푸라기를 잡고 몸부림치는 거였다.
불혹이 되자 또 다른 늪이 기다리고 있었다. 나를 덮친 다발성경화증이란 램프 위 개구리 같다. 조금씩 익어 가는 줄 알면서도 도망칠 수 없다. 혼자서는 한걸음도 한모금도 먹을 수 없어졌다. 사라지고 싶었다. 분노와 자책을 반복하는 세월이었다. 기약 없는 상황에 몸서리치면서도 어쩌지 못했다. 통증과 마비도 습관이 되는 것인지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게 되었다. 그 뻔뻔함이 가끔은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다.
그러면서 쉰을 넘겼을 때였다. 내 생애 일생일대의 일이 생겼다. 누구를 만나게 된 것이다. 형색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한 열세 살의 소녀였다. 그 길 위에서 나를 오래 기다린 것 같았다.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내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다. 걷잡을 수 없이 통곡을 했다. 그 소녀는 바로 오빠 집으로 달려가는 나, 이젤을 펴는 나, 달을 색칠하는 나였다.
열세 살의 나를 만난 후 나는 뒤집어졌다. “꼭 그림을 그려라” 선생님의 목소리가 밤낮없이 나를 흔들었다. 가슴에 앙금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. 휠체어에 앉은 시간이 늘고 책상에 앉아 4B연필을 잡았다. 앙금은 시가 되고 그림이 되었다. 한 장 한 장이 모여 소박한 시화집이 탄생하기도 했다. 무엇보다 일각이 여삼추였는데 여삼추가 일각이 되었다. 통증마저 무중력 상태인 듯 시간이 저절로 흘렀다. 늪이 길이었다니.... 고통은 썩은 껍질이 아니었다. 그 속에 싹을 품고 있었다.
누워 천장을 하염없이 보고 있다. 천장을 보다가 불현 듯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. ‘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행은 아니다’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다. 저 천장에게 지나가는 밤과 낮이 아무렇지도 않듯이. 허공을 위로하는 빛이 되듯이.
사지마비라는 이 환장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천장에 그려보는 자화상이 ‘유레카’다. *ms, 병명그대로 얼마나 멀티플한 생인가? 중학생 미술시간이후 이렇게 심장이 뜨거운 때가 어디 또 있었던가?
살면서 화가가 되지 못했다고 병들었다고 한숨 쉴 일이 아니다. 오히려 나는 슬픈 밤에 별을 만났고 아픔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었다. 내가 살아온 생을 돌아보게 되었다. 그보다 감동적인 명화는 없었다. 기쁨, 슬픔, 사랑, 이별 그런 거....그래도 또 사랑...... 뭐 그런 것들....
“꼭 그림을 그려라”
가슴 저 밑바닥에서 이제야 대답합니다. “네, 선생님.”
*ms – mutiple sclerosis: 다발성 경화증
댓글[1]
열기 닫기